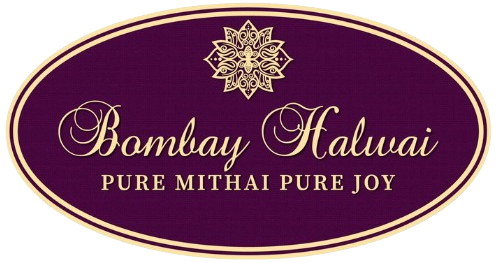대승불교에서의 여래장사상 성립과 사상적 의의 :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삼계는 허위요 마음이 만든 것(唯心作)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파도가 바닷물과다르지 않듯이, 현실세계가 진여와 다른 것이 아니다. 허위의 삼계를 만들어 낸 것은 무명만이 아니고 진여가 그것에 참예되어 있다. 원효는 정토사상(淨土思想)을 천명한 불경을 제외한 그의 모든 저술에서 여래장사상을 표명하고 있다.
본지는 향후 이평래 교수와 각묵스님이 반론을 제기하면 지면을 통해 계속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① 우선 佛陀될 수 있는 性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확신하고②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어 왔음을 크게 뉘우치며 ③ 누구와 수행에 의하여 成佛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④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 노력에 의하여 근본 자리에 되돌아갔을 때 여기에는 始. 本의 구별이 없어지고 淨法의 진여계만 혼도 드러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淨法緣起의 究意點이며 如來藏을 말하는 目的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번뇌는 객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데서 발단된 여래장사상은 『여래장경』에서 ‘일체중생실유여래장(一切衆生悉有如來藏)’이라고 천명한 뒤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청정한 것까지도 포함시켜 아리야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화합식이 되는 것이다. 이 妄과 眞, 染과 淨이라는, 본래 합일불가능한 것을 합일시키고, 아리야식의 전개를 설하는 것은《대승기신론》이다. 따라서 여래장연기설은《대승기신론》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래장은 현실적으로 번뇌에 쌓여 있는 중생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부처와 동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설이다.
‘♣ 부처님 인연 ♣/•극락정토로 가는 길♤’의 다른글
등으로 불리며, 현상심과 같은 장면으로 생각되고 있다. 못을 박을 때는 망치 그리고 나무를 켤 때는 톱을 도구로 삼는 것처럼, 도(道)를 닦을 때 마음을 도구로 삼는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내용을 정상적으로 전송 또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네이버 여행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래의 몸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生身이요, 하나는 法身이다. 생신이라 함은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化生한 몸이다.여래의 몸은 상주하는 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곧 법신이다. ② 여래장사상 제 2기 경전 보성론(4∼5c 성립 견해)에 이르러 그 思想的 體系가 定立 됨으로써 大乘佛敎의 한 학파적 성격을 띠고 조직화된다. 그러나 아직도 煩惱所染에 관한 考察 (즉 무슨 이유로 煩惱에 물들게 되었나?)하는 문제는 충분치 않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如來藏思想의 이상적인 측면 즉 本性淸淨과 마음의 淨化에만 중점을 두고 추구하는 체계에 머물고 있었다.→돈오적 입장의 선풍 이 시기에는 大乘藏儼經論, 佛性論등이 조직되었다.
여래장사상의 성립과 사상적의의
-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여래장사상은 신라시대에만 뚜렷한 사상성을 띠고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여래장의 기초적인 사상은《승만경》에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장의 이러한 견해도 당시 중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었던 『불성론』이나 『대승기신론』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보여진다.
- 윤회의 주체인 아뢰야식으로는 깨달음의 淨法을 발견할 수가 없다.
진여에는 더러움(染法) 이나 허망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망념이 없이 공하다 하여 공여래장이라 한다. 반면에 진여에는 온갖 무루 공덕이다 원만 구족해 있기 때문에 불공여래장이라 한 것이다. 『열반종요』는 부처의 교설 중 가장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집약된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골자를 이론적으로 다듬어서 정리한 문헌이다. 불성과 열반에 관한 원효의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그의 열반관과 화쟁론(和諍論) 및 여래장사상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저술이다. 특히, 『기신론』의 논리에 입각한 불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여래장이 무엇인가를 불성의 이름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여래장은 일체법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므로 유위의 제법도 무위의 제법도, 혹은 미혹해 있는 윤회도 깨달음인 해탈도 모두 여래장에 기반을 두고 성립한다. 그러므로 여래장의 기초적인 사상은《승만경》에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래장에는 또 그 여래와 같은 본질, 불성이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중생의 입장에서 불성보다도 여래장이라는 술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불성과 여래장은 동의어이지만, 하나의 경전에서 동시에 쓰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트만과 여래장의 차이는 아트만이 존재론적으로 설해지고 있는데 비해, 여래장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 여래장과 我의 관계로부터 윤회의 주체로서의 알라야식과 여래장의 관계가 새로운 문제거리로 대두되게 되었다. 여래장은 특징적인 사상임에도 그 사상의 성격상 전반적으로 그다지 조직된 교의를 형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 경전은 꽤 자유로운 형식으로 여래장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여래장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기조가 여래장사상과 서로 통한다고 인정되는 경전도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초기 경전이 종교 문학적인 것에 비해 중기 경전은 교의적 요소가 많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생멸세계는 진여.여래장이 연을 따라(隨緣)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현상을 진여연기(眞如緣起) 또는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라고 한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진여에 무명풍이 불어서 현상세계가 벌어진다고 한다.
즉 여래장과 無明이 일체화한 ‘아라야식’을 토대로 미혹의 인식계의 전개와 번뇌의 斷盡을 연기의 이론을 적용하여 開示한 것은《기신론》에 이르러서라고 볼 수 있다. 여래장과 불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후자의 불성은 주로《涅槃經》에 설해지며, 이 경은 여래장 사상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여래장과 유식의 양 계통의 사상에 대한 전망을 가진《능가경(楞伽經)》도 작성되었다.
여래장사상으로 크게 네 등분「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그 사상은 인도에서부터 이미 출현 전개되어 왔다. 부증불감경 등의 경전은 이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이며, 보성론. 대승기신론 등은 여래장사상을 형성시킨 주요한 논서이다.
‘불교 대백과사전 > 불교의 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처럼 생멸문은 지여문을 의지한 연고로 심생멸 역시 각(覺)과 불각(不覺)의 2종류가 설정될 수 있다. 전자에는 본각(本覺)과 https://bauhutte-g.com/kr-57 시각(始覺)이 있으며 후자에도 근본 불각과 지말불각이 있다. 수행을 통해 이루게 되는 시각도 구경각․수분각․ 상사각․범부각의 4종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각각 마음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래장사상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자비의 측면을 계승하는 사상체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래장 사상은 여래장이 중생심과 불성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라서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래장 교설의 본래 의도는 이러한 난해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 신(信)의 측면을 강조한 불교의 종교적 부흥 운동이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여래장은 중생과 붓다의 동일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의 일원적 사상 또는 성불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의 사상은 모두 이에 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오불이(迷悟不二) 보리 보리심 법신 법계(法界) 자성청정심 등이 그것이다.
같은 유전인자(DNA)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DNA도 연기로서 생긴 것이고, 무아이며 무상이며 불변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부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만일 불성이나 여래장이 불공이요, 존재의 배후에 일심이 상주불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면, 여래장 계열의 경론은 스스로가 불교이기를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불교이해가 수승한 것이라 외친다. 그리고 그들은 여래장에는 공여래장(空如來藏)과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 있다고 말하였다. 만일 여래장이 불공(不空)이라 한다면, 평천창 교수의 말처럼 이것은 공을 무아와 연기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적멸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두 종교는 세계관의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 현상에 있어서 평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시대에 대승불교도가 그 사상을 교의화하려고 할 때 많든 적든 바라문교(Brahmanism)의 자아 철학( tman-vidy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같은 외도 범부의 망상을 부정하기 위해 무아라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주불변하고 진실한 것이 我이므로 여래도 역시 我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승에서 마음을 인과로 나누고 이사(理事)로 나누고 체상용(體相用)으로 나누어 그 관계성을 불일불이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사리불아, 중생계를 떠나서 법신이 있지 않고, 법신을 떠나서 중생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의 여래장(마음)이나 깨달음을 이룬 이후의 여래장(마음)이나 모두 여래장(마음)이다. 불교 2600년사를 통해 전개되어온 불교주류의 가르침은 연기와 무아를 근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용자 분들이 홍보성 도배, 스팸 게시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 등록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여래장이 범부에게 갖춰지는 것은 알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지 붓다의 말씀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붓다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큰 이익이 있다.”고 설해져 있다.
공여래장은 번뇌가 궁극적으로는 허망임을 간파하는 ‘공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불공여래장이란 범부에게 있어서도 眞實佛法이 불공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 ‘불공’도 공의 지혜에 의거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